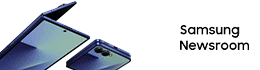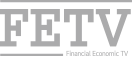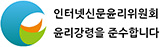![[사진 연합뉴스] ](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935/art_16620816468112_f94301.jpg)
[FETV=박신진 기자]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 공포 등을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작년까지만해도 이들은 증시, 가상자산 등 리스크는 높지만 고수익이 기대되는 ‘위험자산’을 선호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개인투자자들은 은행 예·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말 53조원으로 1년 전 69조원보다 16조원(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70조원에 달하던 투자자예탁금은 한달새 63억원으로 쪼그라들더니 이후 줄곧 감소세를 그렸다. 주식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모양새다.
시장의 흐름도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6.44포인트(2.28%) 급락한 2415.6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8.72포인트(2.32%) 내려 788.32에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82억원, 887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은 1조1480억원을 순매수했다.
작년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열풍이 불었던 가상자산 또한 시들해졌다. 가상자산 투자정보 플랫폼 쟁글에 따르면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거래량은 작년 8월 53조원에서 1년 뒤 45조원으로 8조원(15%) 대폭 줄었다.
위험 자산에서 빠져 나온 돈은 예·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 최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모인 예금 잔액은 729조원으로 한달 새 17조원 불어났다. 1년 전만해도 이들 은행 예금 잔액은 624조원에 불과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역머니무브’를 가속화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작년 8월에만 해도 기준금리는 0.75%로, 1년 간 1.75%p 큰 폭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1%대에 머물던 은행 예적금 금리는 최근 3~4%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3%대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예적금 매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며 주목되고 있다. 채권은 정부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정해진 일자에 상환하기로 한 유가증권이다. 가격 변동 위험이 적고 예금처럼 만기에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일수록 가격이 싸져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채권은 표면 금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장외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총 11조 3433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3조 5000억원이었으며, 작년 한해 동안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채권은 4조 5675억원이었다.
다만 현재 2년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가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시행될 경우 채권 매도분에 대해 과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초 내년 과세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채권 매매차익은 2024년까지 비과세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 시절에 발행된 카드, 캐피탈채의 발행금리(표면금리)는 1~2%대인데, 최근 금리상승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 수익률은 4%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현재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로 인해 2025년 1월 1일 이후 만기 채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확인 등 부도리스크도 체크포인트이며, 유사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은행 계열이나 대기업 계열 회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