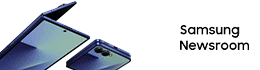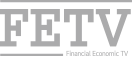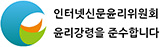|
[편집자주] 과거 산업현장은 잦은 재해와 느슨한 안전 통제로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맞춤형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FETV가 국내 10대 그룹의 재해율은 물론 안전보건 교육과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
[FETV=나연지 기자] 범 현대가(家) 맏형격인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재해율 악화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 현대가를 대표하는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모비스와 비교해 봐도 산업안전 부분에서 2023년 성적은 좋지 않았다. 재해율은 산업안전 관리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FETV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전년 대비 재해율이 악화된 곳은 현대차를 포함 SK하이닉스, GS칼텍스 등 단 3곳 뿐이었다.
특히 악화폭으로 보면 현대차는 전년 대비 0.12 악화되면서 SK하이닉스(0.013), GS칼텍스(0.02)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사진 FETV]](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777025593_57c696.jpg)
범 현대가 내 시가총액 상위로 뽑은 주력 계열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기준 범 현대가내에선 현대차(시가총액 약 40조원), 현대중공업(35조원), 현대모비스(23조원) 순으로 시가총액이 높았다.
이 중 현대차는 지난해 재해율이 상승한 반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는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재해율(100명당 재해자 수)'을 공표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는 '근로손실재해율(LTIFR, 20만 근로시간당 사고 건수)'을 기준으로 삼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표 증감 추이에서는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악화된 흐름을 보인 것이다.
현대차의 재해율은 2022년 0.81에서 2023년 0.93으로 상승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근로손실재해율을 0.301에서 0.244로, 현대모비스는 0.203에서 0.149로 각각 낮추며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성공했다.
![[사진 FETV]](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776855976_93e189.png)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재해율 상승 배경으로 생산라인 대형화에 따른 공정 복잡성, 외주 협력업체와의 관리 사각지대 일부 사업장의 안전 점검 형식화 등을 복합적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장 안전교육 축소가 근로자 안전의식 저하로 이어진 것도 재해율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재해율 상승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계열사별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 점검 체계를 통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건학회 한 관계자는 "재해율과 근로손실재해율(LTIFR)은 단순 사고 통계를 넘어 기업 경영의 내구성과 투자 신뢰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며"특히 글로벌 제조사일수록 산업재해 하나가 브랜드 신뢰, 고객 평판, 투자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