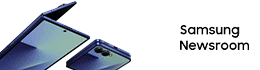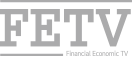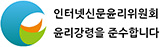"은행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과 친해질 겸 사내 메신저에 '점심으로 함께 짜장면을 먹을 행원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100여 명이 우르르 몰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날 근처 중국집을 급하게 섭외해 다 같이 모여 식사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행장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함께 짜장면을 먹지는 못했지만 그 중국집에 다녀온 동기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행장의 목소리와 생각, 사담(?) 등을 그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행장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A은행 행장을 지낸 한 인사와 얘기를 나누다 짜장면 일화에서 알듯 모를듯한 '감명'을 받았다. 은행 출입기자로서 행장이 행원들에게 느닷없는 '번개', 그것도 식사 번개를 제안한 사례는 처음 듣는다. 이것만으로도 신선한데, 이 '사건'을 기억하는 A은행의 부장을 이후 만나 의도치 않게 팩트체크를 하게 돼 더더욱 신선했다. 이날 짜장면 만남에서 행장-행원 사이 오고 간 대화는 단언컨대 기획하지 않은 척하려는,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공포되는 이른바 '직원들과의 토크'와는 차원이 달랐을 것이다.
은행장 인사철이다. 그런데 은행원들은 은행장 인사에 관심이 없다. 떨어져 나간 후보에게도, 살아남은 후보에게도 관심이 없다. 은행장 한 사람이 행원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대 은행장 중 기억에 남는 행장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B은행에서 PB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B은행 여러 행장 후보 중 결국 누가 될 것 같냐고 지난달 물은 적이 있다. "나도 그렇지만 행원들 대부분은 은행장 인사에 관심이 없을걸. 당장은 우리 지점장의 취향이 내 직장 생활에 더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니까. 여태껏 행장이 바뀐 뒤로 어떤 감동을 느꼈다거나 조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은 경험한 적도 들은 적도 없거든."
'들은 적도 없다'는 친구의 말이 뇌리에 박혔다. 은행 당 직원이 많게는 1만7000명에 달하는데 친구의 말처럼 이들 대부분이 은행장 인사에 관심도, 은행장에게 받는 감흥도 없다면 행장들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는 단어 문장 느낌표 등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5대 은행장 모두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이제 농협은행장 인사만 남았다. 은행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때 "~할 적임자" 문구는 빠지는 법이 없다. 윗선에서만 적임자라고 평가하면 뭐하나. 그 '적임자' 인사 때 정작 구성원들은 '느낌'이 없는데.
이번에 선임된 은행장들은 백번 양보해, 1만7000명 중 절반이라도 행원들이 적임자 단어에 훗날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행장 인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A은행 부장의 고백처럼, 수년이 흐른 뒤 "지금까지도 그런 행장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장을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취임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