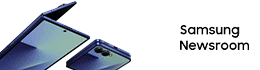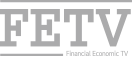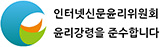[FETV=박원일 기자] 최근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환경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기업이 환경·에너지 부문을 정리하거나 축소하고 다시 주택·인프라라는 본업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기업 입장에서 존립과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신설·확장·축소·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러나 이번 ‘환경사업 엑소더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ESG 열풍은 건설업계의 화두였다.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을 앞세운 환경사업 진출은 시대적 요구이자 기업 이미지 제고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전문성 부족과 수익성 한계가 맞물리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일부는 사업 매각이나 철수를 택하며 재무 건전성 개선이라는 단기 효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당장의 재무 구조 개선은 기업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다변화’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건설업의 전통적 성장축인 주택사업은 경기와 정책 변화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결국 환경·에너지·신산업 영역을 미래 먹거리로 삼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불황기에 대비할 안전판은 사라진다.
건설사들이 취해야 할 방향은 단순한 ‘철수’와 ‘회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다. 섣부른 확장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미래 분야를 외면한 채 과거의 방식에만 안주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없다. 환경사업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선택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비전을 그릴 때 건설업계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결국 건설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ESG라는 유행을 좇는 ‘확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동반한 ‘진화’가 필요하다. 이번 환경사업 철수 움직임이 단순한 후퇴가 아닌 미래를 향한 전략적 재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