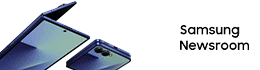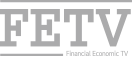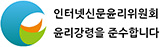여름을 맞아 박세광(가명) 씨는 경북 봉화산 옥수수를 보내 왔다. 청년 농부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에서 만난 것이 6년째다.
그는 서울에서 시스템 컨설팅회사의 사원으로 일하다가 바람 따라 물 따라 사는 삶에 매료되어 홀아버지가 계신 봉화로 내려갔다.
한동안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짓던 그는 상경(上京)도 한 번 하지 않고 농촌 생활에 완전히 젖어 든 듯 했다.
하지만 그의 행복도 잠시에 불과했다.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봉화로 몰려와 그의 옥수수밭이 있는 동네에서 약 20리길 위에 있는 제련소 앞에 진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금속에 오염된 봉화산 농산물을 먹지 말라”며 농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그들은 급기야 환경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딴전을 놓기 시작했다.
박 씨는 아버지의 오래된 신념하에 농약을 아주 조금만 치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으나 ‘중금속에 오염된 봉화산 농산물’ 프레임에 도매금으로 걸려 버렸다.
“꿈을 빼앗긴 것만 같아요.” 박 씨는 4년 전쯤 소주를 마시며 연거푸 한숨을 쉬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움쳤다.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자금도 전부 갖고 고향으로 내려 왔더니 환경단체라는 인간들이 좌절만 안기고 있네요.”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이따금 닭 울음만 간간이 들리는 마을에는 조금씩 적막감이 찾아 들고 있다.
박 씨의 삶에 끼어든 환경단체는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그의 마지막 남은 꿈을 갉아먹고 있다. 20년 전 박 씨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지만 그 윗길에 있는 제련소를 ‘중금속 오염’으로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화롭고 살갑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에 칼침을 놓은 환경단체. 그들의 정체는 주민들도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생활인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동네와 관련이 없지만 귀농해서 환경에 눈을 떴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멀리 안동이나 대구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의 목에서 터져 나오는 “석포제련소 나가라”는 소리는 공장 직원들과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의 가슴에만 멍을 들게 하는 게 아니다.
한참 떨어진 봉화 관내의 농민들에게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전 국민을 죽인다”며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그들은 환경운동에 장착된 군홧발과 총구를 널리 과시하고 있다.
박 씨의 삶은 그저 상처받은 게 아니다. 청년 실업시대에 결혼까지 포기해 가며 모은 목돈과 기회비용을 송두리째 날리게 생긴 것이다.
울고 싶을 때 뺨 한대 더 때린다고 환경단체들은 지난 9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신청’이라는 걸 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20일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한 행정심판에 한 젓가락 들이 밀려고 했던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단체의 참가를 거절하자 그들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해 이의신청을 했다. 행정심판이 열리려면 최소 7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남의 재판에 참견까지 해가며 한 대 더 때리려는 환경단체는 딱 박 씨의 삶에 끼어든 만큼 잔인하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