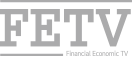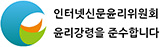[FETV=김현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항공업계가 본격적인 재편 작업에 나섰다. ‘모빌리티’ 그룹을 꿈꾸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아시나아항공 인수한데 이어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 M&A를 확정지었다. 최악의 위기 속 공격적인 투자가 항공업계를 다시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 기업인 제주항공은 2일, 7위 이스타항공을 품었다. 인수금액은 코로나19 여파로 150억원 낮게 책정됐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한 차액 430억원을 지분 취득예정일자인 4월29일까지 전액 납입하기로 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2019년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각각 9.3%, 3.3%다. 합병 이후에는 업계 2위 아시아나항공(15.3%)에 턱밑까지 쫓아오게 됐다.
이번 인수를 통해 제주항공은 기존 45대에서 23대 늘어난 6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 노선도 128개 노선으로 늘어났다. 사측은 “원가 절감과 노선 최적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숙제로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주항공은 2019년, 9년 만에 적자를 올리며 위기경영체제로 전환됐다. 또 미국 보잉사에 2022년부터 5년간 5조원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 맥스 항공기를 구매하는 계약으로 연평균 갚아야하는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 2017~2018년 올린 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부채로 커질 여지가 큰 것이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공급과잉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는 공급 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를 끝으로 국내 항공사는 10개 기업으로 재편됐다. 이 대표가 공급 과잉에 우려를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은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비중이 높아 항공사 숫자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대만 다음으로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비율이 높다”면서 “항공사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석주 대표가 ‘승자의 저주’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기업도 승자의 저주를 풀어야 한다. 2조5000억원을 쏟아 부으며 사업 재편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현금 자산까지 전부 투입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기준 순손실이 무려 8380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손실 금액만 642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있었던 정몽규 회장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100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것이란 말도 나왔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계열사 임원들을 면담하고 있었지만 2월 넷째 주 부터 중단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일정이 있었을 뿐”이라며 “인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은 현대가문의 2세다. 현대백화점과는 ‘기내식 케이터링’, 현대중공업과는 항공유 공급, 현대카드와는 항공사 마일리지 공유 등 범(凡) 현대기업들과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혔고 비행기 노후화 등의 악재가 쌓여 있는 형국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이 전체 비중에서 80%를 넘게 차지한다. LCC업계는 앞선 노선들을 주요 사업지기 때문에 대형항공사(FSC)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주조선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유럽과 미주노선 비중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85대 항공기중 20년 이상된 고령항공기는 18대에 달한다. 여기엔 잇따른 추락사고로 논란이 야기한 보잉사 기종도 포함됐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