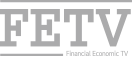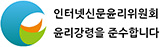| <편집자주>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밸류업 계획 이행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저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 배당 확대 목표를 발표하는 등 실천 의지도 뚜렷하다. 밸류업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행 성적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FETV는 주요 금융지주사별 세부적인 밸류업 계획과 이행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FETV=권현원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밸류업 계획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1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가부양 측면에서는 밸류업 계획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발성 주주환원책이 포함된 밸류업 계획보다는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사 대부분 밸류업 계획 발표…밸류업 공시법인 배당성향도 확대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사 10곳(신한·KB·하나·우리·iM·BNK·JB·메리츠·한투) 중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유일하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됐다. 당시 금융산업군 중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국금융지주가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거래소의 구성종목 특별변경 심의를 통해 신규편입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포함해 금융산업군 중 아직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곳은 한국금융지주와 현대해상뿐이다.
![2024년 배당법인과 밸류업 공시법인의 배당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87766223_5ba77a.jpg)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법인들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 밸류업 공시법인의 배당성향이 전체 배당법인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5.1%인 131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비중의 46.1%를 차지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도 커졌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자사주 금액의 규모는 22조88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자사주 소각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3배 늘어난 19조5900억원이었다. 현금배당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하며 48조3500억원 규모 배당이 이뤄졌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말까지 밸류업 공시(본공시 법인 102사·예고 공시 3사)를 진행한 12월 결산 법인 105사 중 95.2%인 100사가 배당을 실시했다. 밸류업 공시 법인의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전체 배당법인(565사) 현금배당 총액 30조원 중 59.2%인 18조원이었다.
특히 코스피 밸류업 공시법인은 전체 배당법인 평균 대비 높은 시가배당률,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지난해 밸류업 공시법인의 보통주, 우선주 시가배당률은 각각 3.15%, 3.99%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배당법인의 보통주, 우선주 시가배당률은 3.05%, 3.70%였다. 밸류업 공시법인의 배당성향은 40.95%로, 전체 현금배당 법인의 평균인 34.74% 보다 6.21%p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공시법인은 전체 배당법인에 비해 더 높은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국내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주환원 측면은 긍정적…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여전’
밸류업 시행 1년 동안 배당성향 확대 등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다만 최근 국내 주가가 1년 전보다 오히려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는 등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5월 밸류업 공시 시작 당시 2700선에서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2400선까지 내려와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역시 같은 기간 1000선에서 970선에서 변하며 사실상 밸류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국내 금융지주 9사(신한·KB·하나·우리·iM·BNK·JB·메리츠) 기준으로 살펴봐도 최근 11만원선까지 주가가 상승한 메리츠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금융지주사들의 주가는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코스피·코스닥 시장 PBR 기업 비율 변화. [자료 메리츠증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8817161_c8f60c.jpg)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PBR’ 현상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69%가 PBR 1배 미만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73%로 비중이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에서도 PBR 1배 미만 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40%에서 53%로 확대됐다.
밸류업 공시도 단기적인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밸류업 본공시 기업 중 89.4%가 주주환원 관련 재무지표를 핵심목표 지표로 수립한 반면 ▲자본효율성(73.4%) ▲성장성(48.9%) ▲시장평가(30.9%) 관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저평가의 배경에는 낮은 PBR, 불투명한 지배구조, 단발성에 그치는 주주환원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밸류업에서 중요한 것은 공시의 질이며,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라며 “지배구조 개혁 없는 단기 정책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오는 6월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서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인 만큼 큰 줄기는 이어지더라도 세부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다면 정책이 기존 방향과 같을 수는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구체적으로 예측은 없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밸류업 추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다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